|
요즘 각도시군마다 도로 명을 기준으로 한 새 주소 사업을 벌이고 있으나 겉돌고 있다. 여전히 주민들은 새 도로 명 주소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. 집배원들도 새 주소가 생소해 컴퓨터로 일일이 검색을 해 위치를 확인해야 할 정도다.
게다가 내비게이션도 아직 새 주소를 인식하지 못한다. 카드사와 택배업체들도 업무에 차질을 빚기는 마찬가지다. 이름이 지나치게 추상적인데다 일부 주소는 어감이 좋지 않아 바꿔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끊이지 않는 곳도 있다. 새 주소와 기존 지번 주소를 함께 사용하는 기간이 2014년 말까지 연장됐으나 주민들이 혼란을 가져올 것으로 보완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. 새 주소 도입을 시도한 것은 현 주소 체계가 불편했기 때문이다. 지번에 의한 주소로 목적지를 찾아가는 것이 쉽지 않고 도시가 팽창하면서 방문 등 사회복지에도 어려움을 주는 게 사실이다. 그래서 위치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안내해 주는 주소 체계는 절실했다.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체계적으로 부여하는 선진국형 주소 표시 제도를 도입하려는 이유다. 시민 생활이 편리해지고 행정능률이 향상되며 화재나 범죄 등 재난사고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획기적인 변화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. 문제는 1996년부터 시작한 이 사업이 벌써 16여 년이 지났는데도 제대로 정착되지 않는 데 있다. 전국의 자치단체마다 도로의 이름을 정하고 주택에 `새 주소' 명판을 부착해 왔다. 도내에서 이 사업에 쏟아 부은 예산이 약 100억 원이 넘고 엄청난 행정력을 동원했다. 그럼에도 주민 대다수는 새 주소를 잘 모른다. 오히려 “왜 복잡하게 주소를 다시 만드느냐. 종전 주소를 그대로 쓰면 되는 게 아니냐?"는 불만이 커지는 상황이다. 당국이 `새 주소 안내'를 위해 얼마나 홍보에 비중을 뒀는지 의문이다. 그러나 일부측 이야기 일뿐 새 주소는 정착에 나서야 한다. 미국, 프랑스 등 대부분의 국가가 도로 명을 정하고 건물에 번호를 부여해 위치 인식 및 파악이 용이하도록 하고 있다. 물론 현행 지번 주소를 90년 넘게 사용해 이미 관습화돼 있어 새로운 주소가 조기에 자리 잡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. 이제라도 새 주소 이용이 효능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해야 한다. 오는14년 까지 지번 주소를 함께 사용한다고 하지만 이런 추세라면 혼란은 불가피하다. 그래서 이제라도 새 주소를 알리는 데 행정당국은 적극적인 홍보가 절실 하다고 본다. <저작권자 ⓒ 충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>
댓글
|
칼럼·오피니언 많이 본 기사
|









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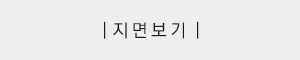




 많이 본
많이 본 








